길 이야기
 행인의 길 담화5. 늦가을에 밟아가는 남고산성길
행인의 길 담화5. 늦가을에 밟아가는 남고산성길
편집인
0
786
2020.02.27 18:23
늦가을 남고산성 길은 한옥마을에서 가까우면서도 운치 있는 산책길이다. 승암산 병풍바위와 마주 보는 동서학동 좁은목 약수터에서 길을 시작하면, 가파른 비탈을 타고 금세 억경대(億景臺)에 올라선다. 남고산성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억경대는, 억만 가지의 경치가 보인다는 뜻을 지녔다. 남고산성 남문 서쪽으로 잇대어 나간 성벽의 드높은 날망에 해당한다. 산 아래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 숲 건너 완산칠봉이 보인다.

성벽 아랫자락 나무숲 사이에 남고사가 들어앉았다. 전라북도 기념물 제72호 남고사지(南固寺址) 본래 터 바로 위에 자리한 남고사는, 보덕화상의 수제자 명덕화상이 창건했다, 원래는 나라를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燕國)를 담아 남고연국사(南固燕國寺)라고 불렀다. 조선 세종 때 모든 종파의 불교를 교(敎)선(禪) 양종(兩宗)으로 통합해 48개의 사찰만 공인할 적에 탈락해 세가 위축됐고, 조선 성종 이후 남고사라 칭했다. 해 질 녘이면 남고사에서 울리는 저녁 종소리는 전주팔경의 하나, 남고모종(南固暮鐘)이라 했다.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목탁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어 내려가니, 서문지에 이르러 남고진 사적비가 나타난다. 조선 헌종 때 창암 이삼만 선생이 글씨를 쓴 사적비에는 이 산성이 견훤의 옛 성터였으며 임진왜란 때 성을 수리해 왜적을 물리쳤다는 기록이 있다.
다시 낙엽이 흩어진 숲 속 길을 따라 만경대(萬景臺)에 이른다. 남고산성에서 억경대가 서포루대(西砲樓臺)였고, 천경대가 남포루대(砲樓臺臺)였던 것에 비해, 만경대는 포루대가 아니면서도 조망이 매우 뛰어나다. 조선 후기 인문지리지 <여지도서(輿地圖書)>는 “돌 봉우리가 기이하게 솟아 마치 안개구름처럼 보이는데, 그 위에는 수십 명이 앉을 만하며, 온갖 모습으로 변화하는 경치를 뽐내고 있다.”라고 했다. 만경대 바위에 새겨진 ‘만경대’ 암각서에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시가 새겨져 있다. 태조 이성계가 황산 싸움에서 승리하고 전주를 찾았을 때 동행한 포은이 말을 달려 이곳에 올라 남겼다는 시다. 임금이 있는 북쪽을 바라보며 쓰러져가는 고려왕조를 걱정한 우국(憂國)의 시는 수백 년이 흘렀어도 바위에 남았다. 만경대에서 성벽을 따라 서암문지 내려가는 길은 가파르다. 암문(暗門)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데에 만들어 둔 일종의 비밀 문이다. 정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서 평시에는 성벽과 다름없이 막아 두고 전쟁 때 적의 눈을 피해 구원 요청을 하거나 적을 기습하는 통로였다. 그 아래 물 맑은 골짜기에 삼경사가 숨었다.
왼쪽으로 발길을 돌리면 성 안쪽, 산중에 숨은 넓은 터가 한가롭다. 순조 13년에 보수공사를 할 때 성 안에는 민가 100여 채가 있었다고 한다. 우물만 해도 25군데, 연못이 네 군데가 있었다 하니 제법 규모를 갖춘 삶터였으리라. 우거진 숲 사이로 황톳길이며 생태습지가 있다.
관성묘(關聖廟)는, 중국 후한의 장군이던 관우를 받들어 제사하는 사당이다. 관우의 초상이 있고 삼국지를 그린 벽화가 큼지막하다. 1895년 전라도 관찰사 김성근과 산성별장 이신문의 발기로 건립돼, 남고진 관아와 화약고가 함께 있었다. 성 안을 거닐다 돌아 나오면, 삼경사 앞 약수터에서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일 수 있다. 다시 성벽을 타고 천경대(千景臺)에 오르면, 저 건너 만경대 너머로 억경대다.
걸음을 더 재촉하면 동포루대에 이르러 고덕산 길과 억경대 방면 성벽을 타고 도는 길이 나뉜다. 고덕산 길은 다시 왼쪽 고덕산길, 오른쪽 보광재길로 갈린다.
_김행인(金杏仁. 시인. 마실길 안내자)

성벽 아랫자락 나무숲 사이에 남고사가 들어앉았다. 전라북도 기념물 제72호 남고사지(南固寺址) 본래 터 바로 위에 자리한 남고사는, 보덕화상의 수제자 명덕화상이 창건했다, 원래는 나라를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燕國)를 담아 남고연국사(南固燕國寺)라고 불렀다. 조선 세종 때 모든 종파의 불교를 교(敎)선(禪) 양종(兩宗)으로 통합해 48개의 사찰만 공인할 적에 탈락해 세가 위축됐고, 조선 성종 이후 남고사라 칭했다. 해 질 녘이면 남고사에서 울리는 저녁 종소리는 전주팔경의 하나, 남고모종(南固暮鐘)이라 했다.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목탁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어 내려가니, 서문지에 이르러 남고진 사적비가 나타난다. 조선 헌종 때 창암 이삼만 선생이 글씨를 쓴 사적비에는 이 산성이 견훤의 옛 성터였으며 임진왜란 때 성을 수리해 왜적을 물리쳤다는 기록이 있다.
다시 낙엽이 흩어진 숲 속 길을 따라 만경대(萬景臺)에 이른다. 남고산성에서 억경대가 서포루대(西砲樓臺)였고, 천경대가 남포루대(砲樓臺臺)였던 것에 비해, 만경대는 포루대가 아니면서도 조망이 매우 뛰어나다. 조선 후기 인문지리지 <여지도서(輿地圖書)>는 “돌 봉우리가 기이하게 솟아 마치 안개구름처럼 보이는데, 그 위에는 수십 명이 앉을 만하며, 온갖 모습으로 변화하는 경치를 뽐내고 있다.”라고 했다. 만경대 바위에 새겨진 ‘만경대’ 암각서에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시가 새겨져 있다. 태조 이성계가 황산 싸움에서 승리하고 전주를 찾았을 때 동행한 포은이 말을 달려 이곳에 올라 남겼다는 시다. 임금이 있는 북쪽을 바라보며 쓰러져가는 고려왕조를 걱정한 우국(憂國)의 시는 수백 년이 흘렀어도 바위에 남았다. 만경대에서 성벽을 따라 서암문지 내려가는 길은 가파르다. 암문(暗門)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데에 만들어 둔 일종의 비밀 문이다. 정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서 평시에는 성벽과 다름없이 막아 두고 전쟁 때 적의 눈을 피해 구원 요청을 하거나 적을 기습하는 통로였다. 그 아래 물 맑은 골짜기에 삼경사가 숨었다.
왼쪽으로 발길을 돌리면 성 안쪽, 산중에 숨은 넓은 터가 한가롭다. 순조 13년에 보수공사를 할 때 성 안에는 민가 100여 채가 있었다고 한다. 우물만 해도 25군데, 연못이 네 군데가 있었다 하니 제법 규모를 갖춘 삶터였으리라. 우거진 숲 사이로 황톳길이며 생태습지가 있다.
관성묘(關聖廟)는, 중국 후한의 장군이던 관우를 받들어 제사하는 사당이다. 관우의 초상이 있고 삼국지를 그린 벽화가 큼지막하다. 1895년 전라도 관찰사 김성근과 산성별장 이신문의 발기로 건립돼, 남고진 관아와 화약고가 함께 있었다. 성 안을 거닐다 돌아 나오면, 삼경사 앞 약수터에서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일 수 있다. 다시 성벽을 타고 천경대(千景臺)에 오르면, 저 건너 만경대 너머로 억경대다.
걸음을 더 재촉하면 동포루대에 이르러 고덕산 길과 억경대 방면 성벽을 타고 도는 길이 나뉜다. 고덕산 길은 다시 왼쪽 고덕산길, 오른쪽 보광재길로 갈린다.
_김행인(金杏仁. 시인. 마실길 안내자)
남고산성, 천경대, 만경대, 억경대, 암각서, 정몽주, 삼경사, 서암문지, 남고모종, 관성묘, 김행인, 행인, 마실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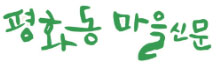 송천동마을신문
송천동마을신문 











